■ 시 아래 쓰여 있는
각각의 글들은
시에 대한 전문적인 분석이나 해석,
그리고 해설이 아닌
개인의 소소한 감상일 뿐입니다.
읽는 사람에 따라 그 감상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람이 풍경으로 피어날 때
사람이 풍경으로 피어날 때가 있다
앉아 있거나
차를 마시거나
잡담으로 시간에 이스트를 넣거나
그 어떤 때거나
사람이 풍경으로 피어날 때가 있다
그게 저 혼자 피는 풍경인지
내가 그리는 풍경인지
그건 잘 모르겠지만
사람이 풍경일 때처럼
행복한 때는 없다
- 정현종, 《사람이 풍경으로 피어날 때》, 전문
✔외로울 때, 위로가 필요할 때, 힘들 때 읽는 짧은, 좋은, 아름다운, 감동적인 겨울 시, 마음의
■ 시 아래 적혀있는 각각의 글들은 시에 대한 전문적인 분석, 해석, 또는 해설이 아닌 개인의 소소한 감상이고 느낌입니다. 오해나 착오없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겨울 팔짱을 끼듯 그대 주머
narrare3.tistory.com
그래도 창문을 통해 햇볕이 들어오나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그것은 찰나에 불과했고, 이내 거의 하루종일 흐린 날이 이어졌다.
새들은 낮게 날고, 공기는 무겁고, 겨울인지 늦가을인지 초봄인지 알 수 없는 하루.
그동안 나는 창밖을 보며 건물이든 새들이든 길고양이든 나무든 간에, 나를 중심에 놓아 다른 사물들은 모두 풍경이라고 여겼다.
마치 액자 속에 들어있는 그림을 들여다보는 느낌이라고 할까.
그렇지만 곰곰이 생각해 보니 유유히 하늘을 날아가는 새들이나, 맵시 있는 걸음걸이로 여기저기를 돌아다니는 길고양이의 시선에서는 창밖을 보며 멍을 때리고 있는 나도 그저, 풍경의 일부분일 것이다.
마찬가지로 내 곁을 스쳐지나가는 사람들도 내게는 풍경이지만 그들에게는 또 내가 풍경일 것이며, 그들의 입장에서 어떻게 보면 나는 그 풍경에 제대로 녹아들어 가지 못한 사람일지도 모른다.
기왕이면 나도 풍경 속에 멋지게 녹아들어 가는 존재이고 싶다.

원시(遠視)
멀리 있는 것은
아름답다
무지개나 별이나 벼랑에 피는 꽃이나
멀리 있는 것은
손에 닿을 수 없는 까닭에
아름답다
사랑하는 사람아
이별을 서러워하지 마라
내 나이의 이별이란
헤어지는 일이 아니라 단지
멀어지는 일일 뿐이다
네가 보낸 마지막 편지를 읽기 위해선
이제
돋보기가 필요한 나이
늙는다는 것은
사랑하는 사람을 멀리 보낸다는 것이다
머얼리서 바라다볼 줄을
안다는 것이다
- 오세영, 《원시》, 전문
✔연꽃에 관한 시 모음(Lotus, 짧은, 좋은, 여름 관련 시, 오세영 연꽃, 정호승 연꽃 구경, 깨달음,
연꽃 불이 물 속에서도 타오를 수 있다는 것은 연꽃을 보면 안다 물로 타오르는 붉은 차가운 불 불은 순간으로 살지만 물은 영원을 산다 사랑의 길이 어두워 누군가 육신을 태워 붉 밝히려는 자
narrare3.tistory.com
77편, 사랑의 시 | 오세영 - 교보문고
77편, 사랑의 시 | 오세영 시집 『77편, 그 사랑의 시』는 ‘사랑’을 테마로 묶인 사랑의 시집이지만, 저자는 시와 산문을 떠나서 사랑에 관한 지극한 얘기를 하고 싶어 한다. 그것은 영원에 대한
product.kyobobook.co.kr
제목인 '원시(遠視)'는 '멀리 보다, 멀리서 바라보다' 정도로 해석하시면 된다.
왜 그런 말이 있지 않은가.
열심히 그 상황에 발을 담그고 있을 때는 보이지도 않고 알지도 못하다가, 거기에서 한 발짝 떼고 조망할 수 있을 때 비로소 보이고, 비로소 알게 된다고.
그것이 어떤 일적인 프로젝트든, 뜨거운 사랑이든, 격렬한 논쟁이든 간에, 적어도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어느 정도의 심리적 거리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예를 들어 지나치게 친해지면 상대의 아주 개인적인 일까지 알려고 들고, 심지어는 미주알고주알 상대에게 맞지도 않는 충고까지 늘어놓는 바람에, 다시 멀어지는 경우를 많이 본다.
사랑도 그렇다.
분명 공통점 때문에 강렬하게 끌리지만, 상대와의 차이점을 인정하지 못하고 나에게 맞춰달라고만 한다면, 어느 정도의 거리가 있는 사이였을 때가 더 좋았다라고 여기는 때가 올 수 있음을, 사랑을 해본 사람들은 알 것이다.
너무 가까이에 있으면 무지개도, 별도, 벼랑에 피는 꽃도 볼 수 없고, 마침내 그 사람을 졸졸 따라다니는 슬픔도 눈물도 볼 수가 없다.
✔1월의 시, 1월 관련, 새해 짧은, 좋은, 아름다운, 감동적인 시 모음(오세영 1월, 정연복 새해 아
■ 시 아래 쓰여 있는 각각의 글들은시에 대한 전문적인 분석이나 해석,그리고 해설이 아닌개인의 소소한 감상입니다.따라서 시의 내용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1월1월이 색
narrare3.tistory.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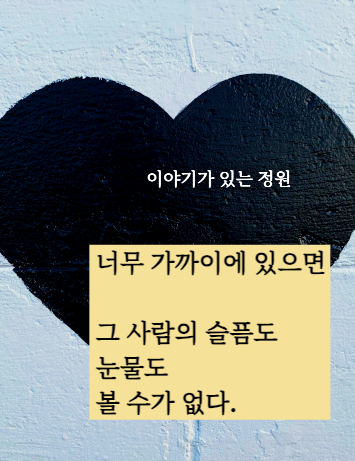
슬픔이 나를 깨운다
벌써
매일 새벽 나를 깨우러 오는 슬픔은
그 시간이 점점 빨라진다
슬픔은 분명 과로하고 있다
소리 없이 나를 흔들고
깨어나는 나를 지켜보는 슬픔은
공손히 읍하고 온종일 나를 떠나지 않는다
슬픔은 나를 잠시 그대로 누워 있게 하고
어제와 그제 그끄제
그 전날의 일들을 노래해 준다
슬픔의 나직하고 쉰 목소리에
나는 울음을 터뜨린다
슬픔은 가볍게 한숨지며 노래를 그친다
그리고 오늘은 무엇을 할 것인지를 묻는다
모르겠어...나는 중얼거린다
슬픔은 나를 일으키고
창문을 열고 담요를 정리한다
슬픔은 책을 펼쳐주고 전화를 받아주고
세숫물을 데워준다
그리고 조심스레
식사를 하지 않겠냐고 권한다
나는 슬픔이 해주는 밥을 먹고 싶지 않다
내가 외출을 할 때도 따라나서는 슬픔이
어느 결엔가 눈에 띄지 않기도 하지만
내 방을 향하여 한 발 한 발 돌아갈 때
나는 그곳에서 슬픔이
방안 가득히 웅크리고
곱다랗게 기다리고 있음을 안다
- 황인숙, 《슬픔이 나를 깨운다》, 전문
✔가을 낙엽 관련 시 모음(황인숙 낙엽비, 정호승 이제는 누구를 사랑하더라도, 이병금 낙엽을
낙엽비 창문 밖을 내다보니 산 언덕 절벽 가을바람에 낙엽비 우수수 날리며 마지막 잎새는 흩어지며 절벽 밑으로 날리네 구르네 쌓이네 우수에 젖어드는 마음 허우적거리는 아픈 마음 조용히
narrare3.tistory.com
✔우리 동네 고양이(고양이 관련 시, 고양이들의 봄날, 고양이 먹이, 길고양이, 황인숙 나는 고양
봄비가 부슬부슬(지역에 따라 달랐지만) 오기 며칠 전, 3월 마지막 주 어느 날, 벚꽃은 피었다. 그때는 이렇게 비바람이 쳐서 꽃잎들이 일순간에 홀랑 떨어질 줄 알지 못했다. 사는 것에 치여, 올
narrare3.tistory.com
살다보면 슬픔이나 상실은
전혀 예기치 않은 순간에
우리를 찾아오곤 한다.
하지만, 오히려 그 고통이
우리를 앞으로 나아가게 하리라는
확신이 드는 때가 있다.
슬픔이나 상실에도 불구하고
잘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슬픔과 상심 덕분에
더 잘해 나갈 수 있다는 마음.
내 손에 들려 있는 건
텅 빈 그릇이지만,
앞으로 그 그릇을
채워나갈 수 있으리라는
희망이 있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
우리는 그런 마음을 일컬어
'치유'라고 부른다.
- 출처 : [교보문고]
「그래, 지금까지 잘 왔다」
(셰릴 스트레이드)
중에서
그래, 지금까지 잘 왔다 | 셰릴 스트레이드 - 교보문고
그래, 지금까지 잘 왔다 | 세계적 베스트셀러 《와일드》 의 작가, 셰릴 스트레이드가 서른의 그녀들에게 보내는 ‘응원과 위로의 메시지’ 9개의 산맥, 사막과 황무지, 인디언 부족의 땅으로 이
product.kyobobook.co.kr




댓글